1 서장
육소봉, 그는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의 전기(傳奇)적인 일생 중에는,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사람들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하고도 환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흥미진진한 환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럼 먼저 육소봉의 주위에 있는 기기묘묘한 사람 몇을 소개하고, 그런 후에 소봉과 그들이 펼치는 기상천외한 활극과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웅노파의 군밤
보름달, 안개. 짙은 안개 속으로 보름달이 떴다. 달빛은 처량하고 흐릿하여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장방(張放)과 그의 친구들은 달빛을 받으며 짙은 안개 속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지금 그들은 멀리서 화물을 부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까지 거나하게 걸친 그들은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모두 풀려진 상태였다.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었을 때, 그들 앞에 웅(熊)노파가 나타났다.
웅노파는 유령처럼 안개 속에서 홀연히 나타났다.
노파는 큰 돌을 등에 지고 있는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었고 허리는 금세 부러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두꺼운 천을 두른 큰 대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 바구니 안에 뭐가 있는 거요?"
장방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지금 그들은 기분이 느긋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라도 흥미가 있었다.
"군밤이라오."
웅노파의 주름진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향기롭고 따끈한 군밤이라오. 한 근에 10문(文)입죠."
"다섯 근 주쇼. 한사람에 한 근씩."
군밤은 따끈했고, 달고 향기로웠다.
장방도 군밤을 하나 먹었다. 그는 군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술까지 많이 마신 후라 먹자마자 그만 속이 거북해 토할 것만 같았다.
그가 막 토하려고 할 때쯤 동료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 보았다. 그들은 쓰러지면서 몸이 즉시 뻣뻣하게 굳었고, 입에서는 거품처럼 하얀 액체가 흘러나왔다. 하얀 액체는 곧 피에 섞여 벌겋게 변했다.
웅노파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말할 수 없이 음흉하고도 무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 망할 놈의 할망구, 군밤에 독을 넣다니!"
장방은 이를 악물고 기어서라도 노파에게 가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의 힘이 모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노파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으나 노파의 발 앞에 이르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처박고 엎어졌다.
그는 노파의 회색 솜치마에 가려진 발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새색시처럼 색깔이 고운 꽃신을 신고 있었다.
그런데 신발에 수놓아져 있는 문양은 원앙이 아니라, 한 마리의 부엉이, 녹색 눈동자의 부엉이였다. 그것이 장방을 노려보며 그의 우매함과 무식함을 비웃는 것 같았다.
웅노파는 키득키득 웃으며 기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녀석! 꽤 밝히는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자의 아랫도리를 훔쳐보려고 안달을 하다니 쯧쯧."
장방은 힘겹게 고개를 쳐들곤 물어보았다.
"도대체 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우리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멍청한 녀석,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과 무슨 원한이 있겠느냐?"
"그럼 왜 우리들을 해치려는 거냐?"
장방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웅노파는 음흉하게 말했다.
"이유는 없어. 단지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기 때문이야."
웅 노파는 고개를 들어 짙은 안개 속의 보름달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달이 둥글 때면 나는 살인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흘흘흘!"
장방은 분노와 공포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갑자기 웅노파는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밤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달은 더 둥글어졌다. 웅노파가 사라진 뒤 그곳에는
짙은 안개 속에 스산한 바람이 휑하니 맴돌았다.
노실화상(老實和尙)
석양이 지고, 갈바람이 갈대숲을 흔들고 있었다. 강기슭은 아득하고 멀어 인적이 없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강가에 있는 배의 돛대에 내려앉았다. 이곳은 한적한 나루터인데 지금 마지막 배 한 척이 떠나려 하고 있었다.
배를 젓는 사공은 수염이 하얗게 센 늙은이였다.
20년 동안, 그는 매일 강기슭을 기점으로 이 낡은 배를 저어가고, 다시 저어오곤 했다.
그를 즐겁게 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술을 마시는 것과 도박만이 그가 즐기는 유일한 오락이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결코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화상이 한 명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은 어수룩해 보였지만 예부터 중을 보면 노름에서 돈을 잃는다는 속설이 있다. 사실 뱃사공은 이제까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
그 화상은 단정하고 예의바르게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기 발을 보고 있었는데, 발은 매우 더러웠고 더러운 발에는 다 떨어진 짚신이 신겨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와 멀리 떨어져 앉았다. 그의 몸에 득실거리고 있는 이가 자기들의 몸으로 옮겨 올까 두려운 까닭이었다.
중년 화상도 감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는 어수룩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강도들이 배 위로 뛰어들 때도, 그는 고개도 쳐들지 않은 채 나룻배 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것만 듣고 있었다. 네 명의 강도는 배위로 뛰어올라 오자마자 무턱대고 엄포를 놓았다.
"우리들은 수사방(水蛇幇)의 호걸들이다!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단지 너희들 주머니 속에 든 은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패물을 모두 내놓아라. 그리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야."
노을이 그들의 칼을 비추자 그 칼 빛이 배안에 섬뜩하게 번쩍였다.
배 안의 남자들은 부들부들 떨었고, 여자들은 소리 내어 울었다. 지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떨었고, 눈물도 더 많이 흘렸다.
늙은 중은 여전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자기 발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한 모양의 발이 보였다. 뾰족하고 큰 신발을 신은 커다란 발이 그의 앞에 우뚝 섰다. 그 큰 발의 주인이 말했다.
"네 차례다. 빨리 내놓아라."
중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우물쭈물하며 물었다.
"제게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돈이면 돼, 돈 말이야. 모두 다 내놔!"
"저는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중의 머리는 더 깊이 수그러들었다.
그 강도가 발길질로 그 중을 차려고 하자 옆에 있던 그의 다른 패거리들이 그를 말렸다.
"이봐! 잠깐만, 이 지저분한 중한테는 땡전 한 푼 없을 것 같다, 그만 빨리 돌아가자!"
그들은 올 때도 빨리 왔지만, 갈 때도 순식간에 가버렸다.
배 위는 갑자기 술렁거리며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강도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중에게 욕을 했다.
"그것 봐, 중을 봤으니 재수가 없지!"
그들은 욕을 하면서도 중이 듣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중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매우 불안해 보였다.
그러다 느닷없이 그 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뱃머리로 달려갔다.
뱃머리에는 배가 강기슭에 닿았을 때 사다리로 쓰는 판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중은 그 나무 판자를 주어들더니, 주먹으로 살짝 쳤다. 세 치(9cm) 두께의 나무판자는 대번에 대여섯 조각으로 갈라졌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중이 첫 번째 나뭇조각을 던지자 나뭇조각이 물 위에 떨어졌다. 그리곤 그는 날아서 발끝으로 그 나무판자 위에 가볍게 올라섰고, 두 번째 조각을 이어서 던졌다. 그리곤 한 마리의 물을 차는 잠자리처럼 날렵하게 두 번째 조각 위로 올라서는 것이었다.
수면에 네댓 개의 나무판자를 내던지며 그는 도적들의 쾌선을 뒤쫓기 시작하였다.
물뱀파의 강도들은 오늘의 수입을 계산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신선처럼 날아와 가볍게 뱃머리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바로 아까 보았던 그 지저분한 중이었다.
이렇게 물 위를 나는 경공술을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경공술의 주인공이 바로 그 중이란 데 대해 그들은 더욱 놀랐다.
‘이 중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우리들이 재물을 다 모은 후를 기다려 뺏으려고 한 것이 분명해.’
강도들의 손에는 땀이 흥건히 고이며 이 중이 원하는 것이 목숨이 아니라 돈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중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더니, 공손하게 말했다.
"저는 원래 네 냥의 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요. 새 옷과 새 짚신을 사려고 한 것이었습지요."
그는 몸에서 은전을 꺼내 그들 앞에 내놓고 말을 이었다.
"출가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나는 방금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들 놀라서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중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당신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한 명의 강도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좋아요, 우..... 우리들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음성은 아주 나직하여 잘 들리지도 않았다. 중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나면서, 갑판에 퉁, 퉁, 퉁, 머리를 찧으며 절을 하고는 천천히 일어났다. 돌연 허공으로 훌쩍 뛰어올라 강기슭으로 날아가더니 갑자기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강도들은 뱃전에 멍하니 서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다가 놀라 떠들어 댔다.
"너희들은 정말로 그가 중처럼 보이냐?"
"중이 아니면 뭐겠어?"
"산보살인가 봐, 틀림없는 산보살이야."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물뱀파의 강도 여덟 명이 모두들 그들의 소굴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두들 편안히 죽어 있었다. 상처도 없고, 독에 중독된 흔적도 없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홍루몽(전4권)--红楼梦-全四册
홍루몽(전4권)--红楼梦-全四册 구술 연변 65년 정치편 --口述延边65年 政治篇
구술 연변 65년 정치편 --口述延边65年 政治篇 장자 (전 2권)--庄子全二册
장자 (전 2권)--庄子全二册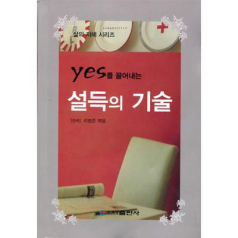 yes를 끌어내는 설득의 기술--说服人的技巧
yes를 끌어내는 설득의 기술--说服人的技巧 독서광 납시오--书迷小组在行动입점신청
독서광 납시오--书迷小组在行动입점신청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22508 [무협소설] 육소봉전기(8)-古龙 |
핸디맨남자 |
2021-11-04 |
0 |
637 |
핸디맨남자 |
2021-11-03 |
0 |
545 |
|
핸디맨남자 |
2021-11-02 |
0 |
656 |
|
핸디맨남자 |
2021-10-30 |
0 |
569 |
|
핸디맨남자 |
2021-10-29 |
0 |
453 |
|
핸디맨남자 |
2021-10-28 |
0 |
540 |
|
핸디맨남자 |
2021-10-27 |
0 |
652 |
|
핸디맨남자 |
2021-10-27 |
0 |
1339 |
|
호수 |
2021-10-07 |
0 |
1433 |
|
호수 |
2021-10-07 |
0 |
961 |
|
호수 |
2021-10-07 |
0 |
749 |
|
호수 |
2021-10-07 |
0 |
1287 |
|
22496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19) |
호수 |
2021-10-01 |
0 |
700 |
22495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18) |
호수 |
2021-10-01 |
0 |
709 |
22494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17) |
호수 |
2021-09-30 |
0 |
474 |
22493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16) |
호수 |
2021-09-29 |
0 |
719 |
22492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15) |
호수 |
2021-09-29 |
0 |
587 |
호수 |
2021-09-27 |
0 |
697 |
|
호수 |
2021-09-27 |
0 |
792 |
|
호수 |
2021-09-17 |
0 |
674 |
|
호수 |
2021-09-17 |
0 |
786 |
|
호수 |
2021-09-16 |
0 |
812 |
|
22486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9) |
호수 |
2021-09-16 |
0 |
976 |
22485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8) |
호수 |
2021-09-16 |
0 |
847 |
22484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7) |
호수 |
2021-09-15 |
0 |
637 |
22483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6) |
호수 |
2021-09-14 |
0 |
799 |
22482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5) |
호수 |
2021-09-14 |
0 |
705 |
22481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4) |
호수 |
2021-09-13 |
0 |
574 |
22480 [연재소설] 아몬드 -손원평 작 (3) |
호수 |
2021-09-13 |
0 |
843 |
호수 |
2021-09-11 |
0 |
922 |
잘보고 갑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번역을 핸디맨님이 직접해서 올린건가요?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한동안 웹소설 번역을 하면서 한국팀에서 얻은 자료입니다.누가 했는지 번역을 잘 했습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