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를 탐내도 될까? (83회) 돌아온 은서.
“실장님!! 보고 싶었어요!!”
은서는 스위스로 간 지 2개월이 좀 지나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누구한테도 돌아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집에서 몇일 쉬다 간만에 가게로 나왔더니 유독 은서를 따랐던 수미가 그녀를 발견하고 거의 안기 듯이 달려왔다.
“잘 지냈어?”
은서가 입매를 곱게 휘며 예쁜 미소를 지었다.
”저야 뭐 맨날 똑같죠. 실장님이 안 계셔서 심심한 것만 빼고요!“
엄마를 만난 아이처럼 수미가 응석을 부렸다.
”이제 여행은 끝내고 다시 가게로 나오시는 거죠?“
들은 소문이 있었지만 수미는 은서한테서 직접 듣고 싶었다. 이제 가게를 다른 실장한테 넘겼다는 그 말을.
”나 다시 스위스 가야 해.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이제 좀 색다르게 살아보려고 해. 스위스, 생각보다도 더 아름답고 낭만적이 곳이었어. 수미도 나중에 놀러 와. 정말 반할 거야.“
잔잔한 미소와 함께 조곤조곤 답해주는 은서의 음성에 수미의 눈가가 붉어졌다.
”진짜 한국을 아예 떠날 생각인 거예요? 정말로 이번엔 여길 정리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길 바랐다. 자신이 처음으로 기댄 어른 같은 언니는 은서뿐이었으니까… 우러러 보고 존경해왔던 사람은 은서 뿐이었으니까.
글썽이는 수미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진 은서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한국엔 자주 올 거야. 가게도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고 가끔 둘러보고 그럴 거야. 수미 연락이라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있으니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면 무조건 전화를 해.“
저를 토닥이며 달래는 은서의 말에 수미는 끝내 눈물을 못 참고 흘러버렸다. 텐프로 룸살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가겠다는 은서한테 여기에 남아달라고 할 미친 말은 못하겠어서 그저 그녀의 품에 깊게 파고들었다.
***
“아저씨.“
은서가 회사 근처로 찾아왔다. 그녀가 말한 식당으로 발을 들이자 은서가 기혁을 불렀다.
”잘 지내셨죠?“
예쁜 눈망울을 깜빡이며 은서가 환하게 웃었다. 2개월만에 만난 은서는 왠지 떠나기 전보다 힘찬 기운을 뿜고 있었다. 미안함에 연락은 못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외국으로 떠난 은서가 걱정 되었던 기혁은 밝은 은서를 보자 저도 모르게 입매를 들어올렸다.
“응. 넌 잘 다녀왔어?”
“그럼요. 너무 재미있게 놀다가 왔어요.”
은서가 기혁을 부른 곳은 회사 근처 꽤 괜찮은 한정식 가게었고 프라이빗한 룸까지 겸한 식당이었다. 그러나 은서는 굳이 룸을 택하지 않았다.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 기혁과는 비밀스럽게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 마음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떳떳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은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가 이내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런 표정을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었으니까.
기혁이가 은서의 앞에 먼저 앉았다. 은서도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은서와 기혁은 서로를 마주하고 바라보았다. 은서가 본 기혁은 여전히 멋지고 근사했다. 느릿하게 감았다가 올린 기다란 눈매는 특히나 너무나도 부드러웠고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은서는 인정을 했다. 권기혁은 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준우와 같이 낯선 스위스로 가게 되면서 사실 두려운 게 많았다. 은서한테는 여행이라 하지만 출근을 해야하는 준우와 매 순간을 같이 할 수 없었으니. 준우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거나 주말에만 동행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어디를 크게 안 다녔던 은서라 겁이 많았다. 특히나 낯선 환경, 낯선 피부색을 마주하니 더욱 그랬다. 그래서 일주일은 그냥 호텔에만 있었다.
스위스에서의 첫 주말이 되어 준우와 함께 기차를 타고 동네를 벗어났다. 기차는 한참을 달려 크지 않은 마을에 멈췄다. 온통 초록으로 뒤덮힌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은 마치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곳 같았다. 알록달록한 건물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아름다움을 뽐냈다. 거기에다가 에메랄드빛 잔잔한 호수까지 겸해 절정을 이루었다. 너무 고요하고 예쁜 곳이었다.
그날 거기서 밤을 보냈고 은서는 다음날 준우와 함께 호텔로 돌아갔다가 짐을 싸고 저 혼자 다시 그 마을로 가보았다. 절경을 이룬 그 곳에 오래 머물렀다. 빡빡하게 돌아가는 한국생활에 비해 너무나도 느긋한 주민들의 삶도 엿보았다.
그래서 그런가. 힘들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많이도 되돌아보았다.
생각을 하다보면 그 속엔 항상 아저씨가 있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제 옆에 묵묵히 있어주었다.
아저씨한테 나는 정말 사랑이었을까. 맑디맑은 19살의 나를 보았던 아저씨한테는 호기심이 생길 만한 존재였긴 했을 거였다. 그래서 내 연락을 기다렸을 거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방 속을 뒤지다가 아저씨가 곱게 접어 넣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수능이 끝나면 해야지. 오늘은 날씨가 춥고 안 좋으니 좋은 날에 해야지.
그러다 군인인데 전화를 한다고 해도 막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이제 정말 성인인데 전화를 해볼까?
… 그러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고 난 아저씨에게 영영 연락을 할 수가 없어졌다.
아저씨보다 내가 더 아저씨를 그리워했다는 건 룸살롱에서 다시 재회한 그날 바로 알아버렸다.
얼마나 그 얼굴을 보고 싶었는지, 그래서 그런 꼴로 다시 마주 했는데도 얼마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지…
비참했지만 달려가고 싶었다.
딱 한 번만 보았던 인연이라서 그런 감정이 들었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처음부터 그랬겠지만 이제 오만하고 밝기만 하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갈기갈기 찢긴 알량한 자존심만 남아 있던 나는 그를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정략결혼까지 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우연히 전해들었을 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다.
아저씨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으니 우린 그에 대해 서로 얘기 할 기회조차 없었다.
난 아저씨에게 물어보기가 무서웠고… 모른 척 했다.
우린 정말 필요한 대화는 한 적이 없는 서로의 껍데기만 위로를 해준 사이였다.
더도 말도 덜도 만 딱 그 자리에서.
그제야 깨달았다. 아저씨가 나를 여자로 보았던 날들은 사실 그리 길지 않았을 거라는 걸.
어른로서의 책임으로 오빠처럼, 가족처럼 나를 곁에서 지켜줬다는걸.
씁쓸했지만, 슬펐지만 인정을 해야 했다. 인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스위스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엔 사실 괴로움으로 가득했다.
어렵게 상봉한 쌍둥이 동생인 하정과 기쁨을 오래 누릴 새도 없이 아저씨와 좋아하는 사이라는 걸 알았을 때 쉬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건 사실이었으니.
어떻게 해야 최선일지 몰라서 준우가 남자친구 인척 연기를 하고 무조건 그 곳을 떠나고 싶었다.
원망…
그때는 원망이 컸었다. 왜 하필이면 내 동생일까. 왜 하필이면….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린 날이 다가왔다.
아저씨가 하정에게 빠질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은 거 같았다.
아저씨는 나랑 같은 얼굴을 한 하정에게서 당찼던 나의 19살을 보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눈길이 갔을 수도 있겠구나. 설마 그랬을까 싶었지만 그 생각이 맞을 거 같았다.
착각이라도 좋았다. 19살의 나를 아저씨는 정말로 궁금해했겠구나. 정말로 좋아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마음을 저버리게 한 건 나였다.
아저씨는 점점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나를 도와주고 싶어했고 그 손길을 거절한 건 나였으니…
어쩌면 하정이가 아니라도 우린 언젠가 헤어짐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였다.
하정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문제였다.
아저씨에게 나는 한때 궁금했던 여자였고 좋아해줬던 상대였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다.
인정을 하고 나니 머리도 맑아졌다. 그 아름다운 마을에서 한달은 넘게 살았다. 아무도 나를 몰라서 좋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준우는 쉴때 찾아왔고 우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준우랑 그렇게 있는 것도 나름 좋았다.
조용한 식사가 끝나고 가게 창밖을 내다보는 기혁에게 시선을 고정한 은서가 입술을 떼었다.
“저번엔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엔 정말이에요. 아저씨.”
기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서를 마주보았다.
“뭐가?”
기혁은 찻잔을 들어올려 천천히 음미했다.
“그때 집 앞에서 만났던 동창말이에요. 우리 만나보기로 했어요.”
찻잔을 들고 있던 기혁이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금방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잔잔한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았다.
“은서야.”
“네. 아저씨.“
오늘은 기혁이가 하고 싶은 말을 끊고 싶지 않았던 은서는 순순히 응답을 했다.
“다시 갈 생각이구나.”
“네. 가야죠.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그 친구 곁에 있고 싶어요. 저도 연애 좀 해봐야죠.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늙긴 싫어요.“
입을 삐쭉 거리며 말하는 은서에 기혁이 눈매가 휘어져갔다.
”널 울리거나 힘들게 하면 바로 연락해. 난 항상 네 편이니까.“
”당연하죠. 아저씨는 영원한 제 보호자여야죠.“
은서가 활짝 웃었다. 밝아보이는 은서를 보며 기혁이도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내 은서가 묻는 질문에 입꼬리를 슬며시 떨구었다.
”하정은 저녁에 만나려고 하는데 둘은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기혁이 답을 못하자 은서는 더 묻지 않았다.
잘 안 되고 있구나…. 왜? 설마 나 때문에??
여러 생각이 든 은서의 눈꺼풀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
맥스 대표가 하정이랑 저녁 약속을 잡고 싶어했다. 영진 그룹에서 동영상 사건에 대해 추궁을 안 하는 것도 모자라 여러 잡음들을 잡아주었고 무엇보다 재계약을 해주었다. 그것도 무려 10년 장기 계약이었다.
하정은 오랜만에 연락 온 은서와의 선약 때문에 대표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을 했다.
“하정 씨는 맥스의 은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정보다 더 정중한 태도를 보인 건 맥스 대표여서 하정이 몸둘 바를 몰랐다. 뭐가 필요하냐면서 그 어떤 자리든 보너스든 다 챙겨주겠다고 했다. 하정은 그런 대표의 호의를 당연히 거절했다. 이번 일은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권기혁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제 기혁에게 맥스에 관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새 따로 맥스를 챙길 줄은 몰랐다.
아이를 포기할 거란 독한 말도 했는데 저 자신이 밉지도 않은지…
하정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서를 만날 장소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네. 하정아.”
밝아진 은서가 약간 업된 목소리로 하정에게 인사를 건넸다.
“응. 그러네. 여행은 잘 다녀왔어?“
“잘 갔다왔지. 하정이 넌 그새… 좀 힘들었었지? 키워주신 아빠가 돌아가셨다면서…”
보송해보이던 얼굴 피부가 약간 거칠어진 하정을 살피던 은서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기혁에게서 들었다. 그런 큰 일을 겪고도 하정은 저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게 내심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런 하정이가 걱정되었다. 하정과 같은 피를 나눈 쌍둥이 자매지만 저 자신은 그녀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이제 괜찮아졌어.”
하정이 옅게 웃어보였다.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상대방이 저를 걱정스레 여기는 게 싫었다.
”다행이네….”
은서가 나지막이 혼자 중얼거렸다.
“강은지.”
맑은 눈빛이 하정을 바라보며 은지라고 불렀다.
“응?“
의아한 하정이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반응했다.
”난 은지 네가 기억을 잃어서 다행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
하정은 은서가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는 몰라 어리둥절해 했고 은서는 그런 하정을 보며 입매를 곱게 올렸다.
내 동생 은지야.
아프지 마.
 파랑새--青鸟
파랑새--青鸟 홍루몽(전4권)--红楼梦-全四册
홍루몽(전4권)--红楼梦-全四册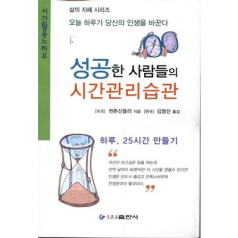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관리습관--成功人士的时间管理方法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관리습관--成功人士的时间管理方法 뇌건강에 좋은 중화요리--补脑吃什么
뇌건강에 좋은 중화요리--补脑吃什么 좌충우돌 몽실이가 사는이야기--东奔西撞,梦实的世界입점신청
좌충우돌 몽실이가 사는이야기--东奔西撞,梦实的世界입점신청